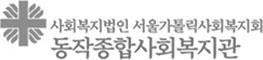"그만 돌아가자구! 다 토해버리겠어!"
"토할 것 같으면 바깥으로 나가서 대가리 내밀어."
한영이 악쓰는 소리를 조루 치료 한림은 그렇게 같타 웃음소리로 받았다. 아마도 고통스러운 멀미와 그에 뒤엉킨 취기 때문이었을까. 한림을 향한 한영의 눈에 적개심 같은 빛이 서렸다. 너 혼자만 뱃놈이란 말이지? 한영은 한림의 턱을 한 대 갈겨주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웃기지 마라. 고래도 한 마리 못 잡은 주제에! 그 헛된 고래 한 마리 못 잡은 주제에! 두 주먹을 불끈 쥔 한영의 상체가 한림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듯싶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내 기우뚱 기울어졌고, 그는 허리깨를 탁자 모서리에 찔리면서 바닥으로 나동그라져 버렸다. 한영의 힘 잃은 머리가 바닥에 나뒹굴던 소주병 파편에 떨어져 내리기 전, 그의 팔을 잡아올린 건 명우였다. 명우는 억지로나마 웃고 있었다.
그랬다. 그는 억지로나마 웃고 있었고, 그 억지로나마 웃음 띄운 얼굴에는 멀미 따위는 찾아보이지 않았다. 그의 희고 창백한 얼굴은 이제 약간의 취기만을 담고 있을 뿐이었다. 어이 없는 일이었다. 그의 멀미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비 오는 바다,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는데...... 저걸 좀 봐요!"